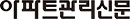주생활연구소 인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도 주택업무편람이 공개됐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다.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친환경주택’, 건설비 절감을 위한 ‘공업화 주택’,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수명 주택’,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뤄졌을 테다. 더불어 생활환경, 소음, 구조, 화재·소방, 환경 분야의 성능을 표시하는 ‘성능등급 표시제도’는 무려 56가지 항목이 제시돼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건설은 거주단계에서의 생활을 고려해 개발된 기술이 집약돼 있다. 이 중에는 홈네트워크, 스마트홈, 에너지 모니터링 등과 같이 첨단기술과 접목된 용어가 등장하는데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되기도 해 첨단기술이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다고 느낀다.
주로 하드웨어에 적용됐던 첨단기술은 가정, 인간의 삶 전반으로 확대됐다. 한국주거학회에서 ‘초연결시대의 기술과 주거’, 대한가정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활용과 선도를 통한 생활과학의 지평 확장’, 한국생활과학회에서 ‘디지털, AI시대의 생활과학 패러다임’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아시아 가정학회(ARAHE: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에서는 2023년 ‘산업혁명의 새로운 경향을 향한 가정학과 기술의 통합’, 2025 ‘미래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첨단 기술 시대의 가정학’을 주제로 정했다.
![스마트하우징 서비스 예시. [출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https://cdn.aptn.co.kr/news/photo/202503/108786_41540_613.png)
첨단기술이 우리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면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돼 구현된다.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 및 지능형 융복합 주거서비스 기술 개발’에서는 스마트하우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거 서비스 확장과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 바 있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생활에서 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공동주택의 건설, 거주자의 생활에 첨단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공동주택의 관리는 대부분 관리주체의 업무로 성립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거주자가 조직을 구성해서 처리해야 할 법적, 행정적 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주체인데 첨단기술이 접목된 하드웨어의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개최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주택관리가 직면한 과제를 살피면서 서비스 계약의 방식 등 제도적인 제약이 주택관리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아파트관리신문 제1523호 관련 기사 참조>
우리의 생활은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몇 발 앞서가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산업은 수많은 행정적 업무처리, 관리감독·과태료의 부담은 창의적인 서비스나 산업의 성장과 맞바꾼듯해 무척 안타깝다. 정부 주도로 첨단기술이 접목돼 공급된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과연 어떤 주거관리 서비스를 원할 것인가?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