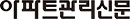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07〉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몫이라는 의미이다. 공동주택 역시 집합건물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 권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에서도 공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엇보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역시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이러한 원칙(잡수입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몫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규약으로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잡수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무자들은 이미 어린이집임대수입이나 중계기임대수입 또는 장충이자수입은 입주자기여수익이라고 외우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 기준에서 벗어나면(이를 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한다면) 당연히 틀린 것처럼 받아들인다. 국토교통부 역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한다고 했다면 국토부의 역할은 이러한 원칙을 설명해주는 것에 그쳐야 하나 오히려 국토부가 앞장 서서(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없고 사적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에만 기재돼 있는)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별개로 그렇다면 상기에서 언급한 입주자기여수익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입주자기여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1. 어린이집임대수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입주민’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등록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원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집임대수입은 ‘입주민’이 기여한 것이므로 공동기여수익에 해당한다.
2. 중계기임대수입 역시 ‘입주민’의 통화품질향상과 재난 발생 시 원활한 통신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입이다. ‘입주민’이 없다면 중계기임대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계기임대수입의 발생원천은 ‘입주민’인 것이다.
3. 장충이자수입은 더더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장충이자수입 역시 입주자기여수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 기회비용(해당 금액을 구분소유자가 직접 납부했다면 ‘입주민’이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았을 이자수입)을 상실한 당사자는 ‘입주민’이므로 장충이자수입의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입주민’이 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면 당연히 구분소유자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구분소유자가 ‘입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가는 행위였음을 알게 된다.
4. 의무관대상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반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러한 구분이 없다. 동일한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인데 의무관리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한 쪽에서는 구분소유자 몫과 입주민의 몫을 구분해야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없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의 구분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1)공동주택에서 이러한 구분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공동주택에서 어떠한 항목이 입주자기여수익이고 어떠한 항목이 공동기여수익인지 역시 ‘선택’할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강조해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