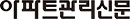위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위탁관리계약 대신 도급관리계약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 계약의 성질이 무엇인지 논란이 된다. 도급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아파트 위탁관리를 위해 체결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성질이 위임계약이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계약에 대해 위임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유형의 계약은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단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위임계약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고용계약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지만 본인의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도급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계약을 이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이라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한 사무는 소유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소유자들은 위탁관리계약을 통해 이러한 사무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게 된다. 이는 민법상 위임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민법 제664조는 일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정의한다. 아파트 관리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물품을 제작하는 것과 같이 일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은 도급계약에 대한 민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의 규정을 본다면 위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관리비 정산’ 때문이다. 도급계약의 경우 정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위임계약의 경우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임의 경우 정산이 필요하고 도급의 경우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오해다. 계약에서 대가를 산정할 때 그 대가를 확정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소요된 비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정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도급계약에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전자는 대가가 확정돼 있고 후자는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대가를 확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꼭 도급계약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의 경우도 위임의 대가를 확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을 산출해 이를 기초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임의 경우 대가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고 도급의 경우 대가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오해는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가 확정액으로 지급되고 어느 경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되는가? 이를 정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다. 당사자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대가를 산정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확정액을 기초로 대가를 산정하기로 했다면 역시 그러한 합의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위임계약이므로 당연히 정산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위탁관리계약에서 관리회사에 지급되는 대가를 확정액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여부는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해서 당연히 대가를 정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의 표준위탁관리계약서에는 관리회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정액제와 정산제로 구분해 어느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유형의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에 관한 법 제도가 법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