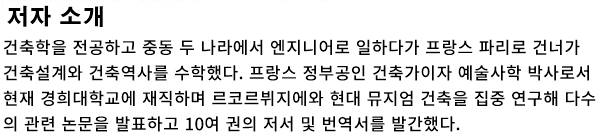[이관석 교수와 함께 하는 역사와 현대 건축의 만남]

대성당 뒤편에서 지면 아래에 신축된 기념관
기원전 3세기 파리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곳인 센강의 시테섬에 파리의 상징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1163년에 착공돼 14세기 중반에 완공됐다. 파리 시민의 영적 안식처였던 이 대성당은 프랑스혁명 때 종교적 횡포가 논란이 돼 ‘이성의 전당(Temple de la Raison)’으로 불리며 내·외부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나 빅토르 위고가 1831년에 출판한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이 선풍적 인기를 얻으면서 프랑스 국민 안에 잠재해 있던 신앙심에 불을 지펴 오늘날처럼 복원됐다.

이 대성당의 바로 뒤편에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 나치 강제수용소로 추방돼 희생된 20만명의 유대인을 추모하는 제2차 세계대전 강제이송 희생자 기념관이 센 강변에서 지면 아래에 건립됐다. 2019년의 화재로 대성당이 복구작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항상 인파로 북적이는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골 대통령이 개관식을 주도했고 2007년에 프랑스 역사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세계 10대 기념관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한 중요한 장소임에도 형태적 드러냄을 최소화하면서 시각적으로 감춰진 것이다. 기념관이 겉으로 많이 나서는 만큼 이웃한 대성당을 가리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상황에서 건축가 팽귀송이 대성당을 배려하면서도 최근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사건을 담은 프로그램을 해석한 결과였다.

늘 사람으로 붐비는 대성당 뒤편의 요한 23세 소공원 옆에 있어 기념관으로의 발걸음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난간 높이의 낮고 무심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편평한 바위처럼 보이는 기념관은 알고 찾아간 사람조차 제대로 간 것인지 망설이게 할 만큼 방문객에게 무심하다. 기념관의 이름도 그 표면에 음각돼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두 개로 분리된 기념관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은 한 사람씩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데, 절망 속에 희생된 개별적 죽음을 환기하면서 분주한 지상과 거리를 둔다. 희생자들을 영웅적으로 띄우기보다는,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통해 강제이송이라는 입에 담기도 싫은 익명의 드라마를 환기한다. 떠들썩한 방문지이기보다는 군중으로부터의 피난처로서, 무거운 마음을 싸매고 묵상하는 장소로의 접근로다.


계단을 내려서면 전방에 감방의 창문 같은 개구부를 통해 센 강의 수면이 보인다. 이 개구부에는 강제수용소의 참혹함을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금속 조각물이 설치돼 있다. 강에서 봤을 때도 이 개구부는 쇠창살이 박힌 감방 창문 같다.
추모와 자성의 장

기념관 앞마당으로 내려서 뒤돌아서면 역시 한 사람씩만 비좁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통해 육각형 평면의 방에 들어가는데, 이곳의 중심에 위치한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이 희생자들을 기억한다. 이 기념관의 벽에는 프랑스 시인이자 작가 아라공, 초현실주의 시인으로 그 자신이 추방자였던 데스노와 엘뤼아르, 소설가 생텍쥐페리, 작가이자 철학자인 사르트르 등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의 문학작품에서 발췌한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바닥의 원형 명패에는 “그들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육각형 방의 양편 채플에는 여러 나치수용소에서 가져온 흙과 시신을 태운 재를 담은 15개의 항아리가 있다. 수용소의 작은 감방을 묘사하는 이 작은 방의 출구에는 나치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독일이 사죄했을 때 이스라엘 총리가 말했다는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Pardonne, n’oublie pas...)”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납골당 같은 전시공간의 입구에서 본 좁고 긴 갤러리의 희미한 조명이 비치는 양측 벽에는 희생자 숫자인 20만 개의 작은 유리 크리스털이 붙어 있다.

고전을 배려하면서도 무형과 간소함으로 일깨운 현대성
밀실 공포증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이 기념관에서는 전쟁과 억압,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감지된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자유를 환기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곳으로, 오직 공간만으로 방문자의 내면을 일깨운다. 고요함과 고독을 통해 묵상하고 명상케 하는 방문 여정은 “피폐케 하는 오랜 고난, 몰살과 타락의 의도를 상기시키려는” 건축 개념이 제대로 발현됐음을 알려준다.
이 기념관은 이렇게 존중해야 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옆에서 새 건물인 자신을 알리고자 애쓰지 않으면서도 생생한 존재감을 잃지 않았고, 자신을 감추고 조형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무형과 간소함으로 현대 건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