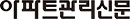본지는 지난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와 동떨어진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본지 제1552·1553·1554·1555·1556호 기사 및 제1554호 사설 참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해마다 현장과 동떨어진 문제로 논란이 되지만,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제도의 구조적 책임임이 분명하다. 시험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출제·시행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서로 무관심 속에 책임을 미루는 사이, 현장은 수험생들의 불만으로 가득하다.
경험 없이 시험에만 합격한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는 위탁관리회사들의 부담도 크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본지는 앞서 회계·시설·민법 과목의 실무 괴리를 지적했으나, 이후 보도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출제하는가’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위원 모집 기준에 따르면, 학계·정부·산업계·기타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학 교수 등 학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관리의 제도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주민의 요구를 체감하지 못한 이들이 본인 전공 지식만을 바탕으로 책상 위에서 문제를 만들고, 공단이 이를 그대로 시험에 반영하는 구조라면 현장 실무 책임자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허하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로서 관리제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위치임에도, 정작 시험 내용과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 기능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또한 자격검정의 기술적 절차와 공정성에만 치우쳐 있을 뿐, 시험문제의 적정성과 실무 연관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 무책임 속에서 매년 같은 비판이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반면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해당하는 ‘맨션관리사’와 ‘관리업무주임자’ 시험 주관기관이 각각 공익재단법인 맨션관리센터와 사단법인 맨션관리업협회로, 이미 업계 실무 기반을 갖추고 있다. 출제위원단 역시 실무와 학계 전문가가 협업하는 구조를 취해, 시험 단계에서부터 관리업의 전문성과 실무 적합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맨션관리자나 관리업무주임자 자격 시험문제들은 실무와 연관된, 현장감 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제1556호 기사 참조>
결국 일본은 제도 설계부터 시행까지 관련된 조직과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한국은 ‘시험은 공단, 관리제도는 국토부, 현장은 민간’으로 분절되어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격시험은 국가의 신뢰를 담보하는 제도다. 대학 전공도 없는 실무형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양성하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진정한 전문가 양성의 통로가 되려면, 출제위원 구성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