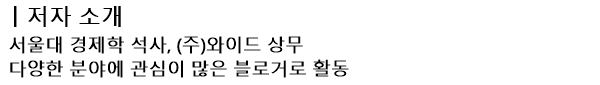최근 ‘마감’이 소재이자 주제인 책을 읽었다. 주인공은 필력은 좋으나 게으르기 짝이 없는 학사였는데 엄청난 원고료에 원고를 청탁받게 된다. 단,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다.
첫 단계는 여유가 있는 단계로 대충 원고의 내용을 구상해 두고 한두장 정도 써두면 마치 나머지는 저절로 쓸 수 있는 듯, 즉 원고를 다 써놓은 듯한 착각에 빠져 부담 없이 놀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마감이 슬슬 임박하는 단계로 그동안 써둔 게 초기에 긁적여 놓은 것 말고는 없다. 이때는 계산을 하게 된다. 즉 20일이 남았는데 100장을 써야 한다면 하루에 5장만 쓰면 된다는 계산이다. 하루 다섯장이면 만만해 보인다. 이런 계산이 나오면 역시 마음이 또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마감이 닥친 상황인데, 이제 원고를 건네지 못하면 목숨을 위태로운 상태다. 둘 중 하나인데 밤을 새워서라도 원고를 끝내거나 아니면 도주를 택하는 것이다. 작품에선 주인공이 도주를 택하면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이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를 구성하게 된다. 원고를 받아야 하는 자들도 추적전문가까지 동원하며 목숨걸고 추적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작가는 마감을 ‘마감(磨勘)’이란 한자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순간 우리가 아는 ‘마감’이 한자였던가 하는 착각을 했었다.
마감(磨勘)은 ‘갈 마’에 ‘헤아릴 감’으로 이 글에서 쓰고자 하는 마감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중국에서 관리들의 성적을 매기던 제도라고 한다. 원고를 ‘마감한다’ 할 때의 ‘마감’은 순우리말이다. 이것은 ‘막다’라는 동사에 ‘-암’ 이라는 명사화 접미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다.
그런데 의외로 마감을 이 한자(磨勘)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시중에 ‘마감(磨勘)’ 이란 시가 있는데, 정확히 이 한자를 쓰고 있다. ‘붓을 놓고 문득 바라보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랑이 종료됨으로써 느껴지는 아픔과 상실감을 표현한 시다.
경북일보의 2015년 10월 29일 자에 실린 최재목의 칼럼을 보면 이 사람은 시인이자 영남대 철학과 교수임에도 버젓이 마감을 한자로는 ‘磨勘’이라 쓴다며 거창하게 마감의 뜻을 풀어쓴 내용이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식자들의 오류 같은 것이라 여겨지는데 자신들이 늘 당하는 ‘마감’에 대해 한자 좀 안다고 하는 식자일수록 마감이란 게 당연히 한자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같다.
박목월이나 최재목같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문인이 마감을 ‘마감(磨勘)’으로 써버리니 이를 접한 대중들은 당연히 한자라고 오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오인을 인정하면 좋은데 박목월의 마감이란 시를 읽은 자들은 더더욱 마감은 한자라며 우기기까지 한다. 박목월이 틀렸을 리 없다는 자신의 습자지 같은 얄팍한 지식이 이런 아집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글은 여기서 마감해야겠다. 어쨌든 마감은 순우리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