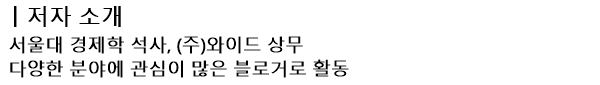이상하게 영어가 아닌 다른 서구언어권 영화들은 잘 몰입이 되지 않아 안 보게 되는 편인데 이 영화는 스페인 영화다. 처음에는 시대적, 장소적 배경조차 몰라 어떤 영화인가 하고 보기 시작했다가 흠뻑 빠져본 영화다.
우리나라 번안 제목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지만 원제는 훨씬 더 시적이다. ‘Palm trees in the snow’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눈속의 종려나무들’이라 해야 한다. 아마도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제목이 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되지 않을까.
아버지가 죽고 서재를 정리하던 클라렌스는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누군가에 꾸준히 돈을 보낸 내용이 담겨있다. 사연이 궁금한 클라렌스는 가족들의 과거를 찾아 아프리카 적도 기니로 떠난다.
적도 기니는 한 때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클라렌스의 할아버지와 클라렌스의 아버지인 하코보, 작은아버지인 킬리안은 식민지 농장의 관리인으로 긴 세월 적도 기니에서 살았다. 클라렌스는 의문의 편지 한 통에 충동적으로 아프리카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적도 기니였던 것이다.
클라렌스의 작은아버지인 킬리안은 이곳에서 적도 기니 원주민 여성 ‘바실리’를 만나 운명같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킬리안은 위독한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킬리안은 스페인에서 여동생의 임종을 지키고 어머니를 돌보며 바실리와는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킬리안이 자리를 비운 사이 킬리안의 방탕한 형 하코보가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바실리에게 몹쓸 짓을 벌였고 이로인해 적도 기니 원주민들의 분노를 사게된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킬리안은 하코보에게 분노하지만 그래도 형제인지라 목숨이 위태로운 형을 탈출시키고 바실리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둘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그러나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적도 기니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모든 스페인 사람들을 추방한다. 결국 킬리안은 홀로 탈출하게 된다. 이후 클라렌스는 다시 찾아간 아프리카에서 바실리를 만나게 되는데···.
짧지 않은 영화였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푹 빠져서 감상했던 것 같다. 여러가지 소회가 있지만 아프리카라는 곳이 내게는 언제나 미지의 대륙이었고 아프리카의 토속문화에 관심이 많은 탓도 한몫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모르는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 역사는 우리 역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탓에 그 아픔이 공유된다고나 할까. 다만 아프리카가 어떻게 서구 열강에 유린됐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어서 그런 배경의 영화가 나오면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편이다.
근자들어 이런 대서사시 같은 작품을 접하는 일이 드문 탓에 오랜만에 대작을 접한 감회도 반갑다고 해야 할듯싶다. 한가지 더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실리로 나왔던 베르타 바스케스의 묘한 매력이다. 92년생으로 에티오피아 출신의 우크라이나 배우라고만 알려져 있다. 작품 속에서 바실리는 매우 신비로우면서도 킬리안과 운명적 사랑을 빠지게 되는데 그 바실리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영화의 제목인 ‘Palm trees in the snow’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연유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난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굴레를 안고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오랜만에 진한 여운이 남는 작품을 만난 듯하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